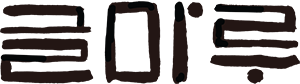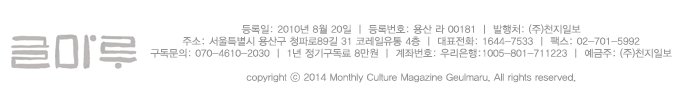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녹만 벗겨내는 일?
역사를 바로 잡는 일!”
글. 김일녀 사진. 박선혜, 이오희 명예회장 제공
국내 문화재 보존과학의 역사는 단 두 명으로 시작됐다. 이오희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명예회장(68)과 유물 복원의 1인자로 꼽히는 고(故) 이상 수 선생이 40여 년 전 개념조차 생소했던 문화재보존과학의 길을 열었다.
중앙박물관 내 빈 사무실, 임자는 따로 있었다
동국대 불교예술문화학과를 수료한 이 명예회장은 1970년대 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 관리하는 일을 했다. 당시만 해도 유물이 발굴되면 수장고에 보관하는 게 전부였는데, 수장고의 보존 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각 유물 카드에는 발굴 당시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 속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부식되고 파손된 유물이 많았다. 그때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석굴암보존 등의 문제로 방한한 도쿄국립문화재연구소측에 수장고의 현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1975년 그는 일본으로, 이상수선생은 대만으로 유학을 떠나 각각 금속 유물과 도자기 보존처리 기술을 배웠다. 1년간 공부한 뒤일본에서 돌아왔지만 주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보존처리실은 만들어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유물부 소속이었다.
“저뿐만 아니라 이상수 선생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만히 보니, 둘 다 그대로 눌러앉게 생긴 거예요.”
그때 박물관 내 99㎡(30평)짜리 사무실 하나가 비게 됐다. 고고과에서 유물정리실로 사용하려고 점찍어 둔 곳이었다. 하지만 임자는 따로 있었다. 이 명예회장과 이상수 선생이 고고과는 물론 상사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책상과 유물을 옮겨 보존처리실로 사용한 것이다. 고고과의 눈총이 따가웠지만, 다행히 고(故) 최순우 관장의 허락과 함께 특별 예산을 지원받아 현 보존과학부가 탄생하게 됐다. 이후 이들이 처음으로 보존처리한 유물이 바로 서울 삼양동에서 출토된 금동관음보살입상(국보 127호)이다. 일본 유학시절 샘플로 가져온 보존처리 약품도 이때 사용했다. 이 약품을 이쑤시개에 묻혀 불상의 녹을 제거했다고 한다.

문화재 보존처리를 위한 기계도 그 당시 처음 제작됐다. 철제 유물은 오래되면 푸석푸석해지면서 약해져 강화를 시켜야 하는데, 진공 상태에서 유물 내 산소 등을 다 빼내고 그 작은 구멍 안에 강화수지를 유입시키는 기계가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국내에는 그런 기계를 만든 사례가 없었다.
“서울 청계천에 있는 한 업체에 설계도를 주고 의뢰를 했어요. 만들어 오긴 했는데, 진공이 안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했던지 아예 박물관 뒤뜰에 산소용접기 등을 가져와 만들었어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이 명예회장은 국내 처음으로 유물에 비파괴 X선 투과촬영을 시도했다. 1979년 계명대학교 박물관 보존처리실에서 가야 무덤인 경북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의 보존처리를 도맡아 하고 있을 때였다. 그중 철제 환두대도(은상감당초문환두대도, 고리자루칼)를 가득 덮은 녹을 벗겨내던 순간 그의 눈에 ‘반짝’하는 게 보였다. 그는 ‘상감’이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X선 촬영을 시도해 상감기법임을 밝혀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당시 대구에서는 문화재에 X선 촬영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대포 등 무기류의 결함을 확인하는 회사에 맡겼다. 그의 직감은 적중했다. X선 촬영 결과 환두 부분(고리)에 은실로 새긴 당초문양이 발견된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가야를 포함한 삼국시대 금속 유물에서 상감기법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만큼 고고학과 미술사학계에 귀중한 자료가 됐다.
“X선 촬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에서 직접 해봤기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깨 너머로 보기만 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령 지산동 고분군 출토 유물은 발굴과 동시에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를 한 첫 사례가 됐다. 이후 보존과학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각 대학교 박물관마다 보존처리 시설을 갖추는 곳이 늘어났다. 때문에 환두대도는 40년간 문화재 보존처리에 몸담아 온 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유물 중 하나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 처리는
역사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합니다.
유물이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녹슨 상태의 파편으로는 할 수가 없죠."
역사를 바로 잡는 매력에 빠지다
환두대도가 고고학계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면 고령군 지산동 32호 석실에서 출토된 갑옷과 철제투구는 역사를 바로 잡은 귀중한 증거물이다. 물론 이 또한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녹덩어리를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갑옷임을 밝혀낸 후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가야시대 갑옷은 부산 동래구 연산동 갑옷과 1972년 경남 함안군 수동면 상백리 출토 유물 등 2점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비슷한 갑옷이 한 고분에서 5~6점씩 나오는 상황이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의 한 고고학자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것은 일본 무사가 입었던 것이거나 가야 장군이 죽었을 때 일본 갑옷을 함께 묻은 것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뒤 가야 고분 발굴이 본격화됐고, 실제 많은 갑옷이 나왔다. 이로써 임나일본부설 주장의 근거 하나가 역사적 증거물 앞에 무릎 꿇게 됐다.
그는 보존처리를 하더라도 발굴 당시 유물에 없었던 부분, 즉 모르는 부분을 인위적으로 복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문화재의 본질을 왜곡시키거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유물과 관련된 인접 학문도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고색창연한 맛이 진짜죠”
그는 1970~80년대 신안해저발굴조사 당시 이야기를 들려줬다. 당시 많은 유물이 출토됐는데,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일부 금속 유물의 보존처리를 모 대학의 화학과 교수에게 의뢰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화학자가 보기에 ‘녹’은 제거의 대상에 불과했던 것. 그는 약품을 이용해 전기를 발생시켜 모든 녹을 싹 없앴다. 녹은 말끔히 사라졌지만, 고색창연한 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유물 앞에 최순우 관장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한다.

“문화재 보존과학자라고 해서 녹만 벗겨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장인이 유물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최소한의 정보를 거기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이는 그의 문화재 보존처리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머리와 가슴 그리고 손을 중요시하는데, 머리는 보존처리(과학)와 유물(고고·미술학)에 대한 지식을, 가슴은 유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손은 머리와 마음을 합쳐 우러나오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좋은 보존과학자가 될 수 없다고 후배들에게 강조한다고 했다.
현재 서울시 문화재위원을 맡고 있는 그는 몇 년전부터 전통기술을 살리고 해당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8년 숭례문 화재이후 단청 복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전통기술 및 전통 재료를 되살리는 데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
“일본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당의 경우 300년 전보존처리 기술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30~40년마다 보수를 합니다. 재료 또한 일본 내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일본이나 중국은 내부 단청은 보수하지 않고 보존합니다. 하지만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뒤 그나마 남아있는 단청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죠.”
그러면서 현 문화재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문화재는 천천히 가야 하는데, 단순히 서류만 갖춘 행정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결국 문화재청장 등 주요 관리자들이 문화재 보존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재임 당시 ‘문화재 종합병원’이라 할 수 있는 문화재보존센터(현)를 세웠고, 사립대에 관련 학과를 만들기도 했죠. 기본, 곧 전통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