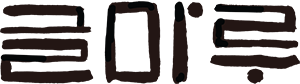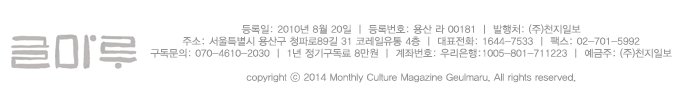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
- 어느새 그(최인호)는 미니스커트, 송창식의 통기타, 칸막이가 있는 생맥주 집 등과 함께 70년대 저항적인 청년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 돼 있었다. 장석주 <나는 문학이다>-
구도의 삶을 그리다
최인호 작가는 구도자의 삶도 살았다. 일찍이 명성을 얻었다고 삶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았다. 1987년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받으며, "풍요로움 속에서 황폐해져 가는 내면이 종교로 이끌었다"는 고백이 인상적이다. 그는 故 김수환 추기경, 정진석 추기경 등과 가까이 지냈다. 그가 신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1993년 서울대교구 주보에 ‘말씀 이삭’을 연재하면서부터 알려졌다. 이후 <길 없는 길> <할> 등 종교를 소재로 삼은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평소 “내 정신의 아버지가 가톨릭이라면 내 영혼의 어머니는 불교”라며 “(자신을 )불교적 가톨릭 신자”라고 소개해왔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면서 불교를 각별하게 생각했다. 그에게 신앙은 절대적이었다.
저는 주님에게만은 거짓말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진실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잊히지 않고 싶은 분은 오직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만년필을 잡은 제 손 위에 거짓이 없게 하소서. 제 손에 성령의 입김을 부디 내리소서.
투병 중에서도 강인한 정신력과 여유는 신앙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손발톱이 빠진 상황에서도 골무를 차고 두 달에 걸쳐 육필로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이 작품을 통해 투병 직전 역사소설에서 현대소설로 전환하고 싶어 했던 꿈을 이뤘다. 이어 묵상 산문집 <하늘에서 내려온 빵> <인연> <천국에서 온 편지> 등을 출간했다.
교복 차림으로 등단한 최인호 작가는 ‘최연소 신춘문예 당선’ ‘최연소 신문 연재 소설가’ ‘작품이 가장 많이 영화화된 작가’ ‘잡지 역사상 최장기간 연재한 작가’ 등 기록을많이 남겼다.
최인호 하면 담배 대신 시가를 물고 반달같이 휘어진 눈웃음을 짓는 모습이 떠오른다. 날카로움보다 부드러움이 그와 어울린다. 음침한 어둠보다는 천진난만한 빛이 어울리는 이야기꾼이다. 조용하지만 강하다. 작품세계가 그러하다. 운명하기 보름 전, 그가 아내에게 말한 한마디가 있다.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난다. 당신은 나의 먼지. 먼지가 일어난다. 살아야 하겠다. 나는 생명, 출렁인다.”
그는 구차한 삶이 아닌 정신적 삶을 원했을 테다. 최인호, 최 베드로 모두 그다. 그리고 그의 세계가 오롯이 담긴 수많은 이야기는 독자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선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