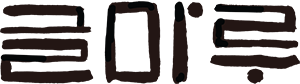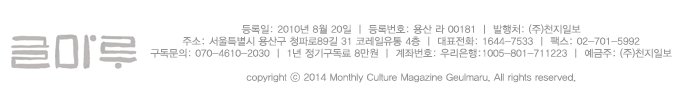나무에
글을
새기다
석로 김창식 서각 명인
글. 이예진 사진제공. 석로 김창식 명인
작품하는 김창식 명인
김창식 명인 작품(세한도)
흡사 창고처럼 보이는 곳에 나무가 켜켜이 쌓여있다. 목수가 사용할 것만 같은 톱과 같은 연장들도 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나무에 글과 그림이 새겨진 작품들이 벽에 걸려있다. 이곳은 목수의 창고가 아닌 김창식 서각 명인의 공방이다.
공방에서 만난 김 명인의 모습은 흡사 도인의 모습처럼 보였다. 이마가 훤히 드러나게 묶은 머리와 턱에 난 수염 때문이었다.
김 명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예를 시작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로도 예술을 놓지않았던 그는 30대에 서각을 시작했다. 서예부터 생각하면 40여 년 동안 예술의 길을 걷고 있는 김 명인은 금초 정광주 선생으로부터 서예를, 백남 나갑 선생으로부터 서각을 배웠다.
나무에 글을 새기는 서각
서각은 나무에 글이나 그림을 새기는 예술이다. 나무뿐만 아니라 돌이나 기왓장에도 새길 수 있다. 김 명인은 “어느 날 전시회에서 서각 작품을 봤는데 매력 있어 보였다. 나도 나의 글을 나무에 새기고 싶었다”며 서각을 시작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30대부터 시작한 서각을 벌써 20년이 넘게 하고 있다.
그는 “서각은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했다. 글씨뿐만 아니라 글씨를 새기는 나무, 나무 위에 입히는 색채 등 모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나무에서 글씨를 뽑아 표현하는 그에게 나무를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무의 경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공기 중 수분이 많은 여름보다는 건조한 가을, 겨울에 작품 활동을 많이 한다. 뒤틀림이 적기 때문이다.
김 명인은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 먼저 구상하는 것이 있다. 바로 글씨이다. 어떤 글을 어떤 글씨체로 표현할 것인지 종이에 붓으로 먼저 써본다. 서예를 배운 경험을 살리는 것이다. “먼저 글을 써보고, 글자를 뺍니다. 글씨를 구상할 때 양각, 음각을 생각하고 나무를 고르죠.”
“숨어있는 필맥을 표현하는 음각이 더 매력적입니다.”
서예를 먼저 배웠던 김 명인은 자필자각(자신의 글씨체를 직접 나무에 새김)에 능하다. 누군가의 글씨를 따라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색채를 가진 글씨체를 표현한다. 자신만의 색채를 가진 김 명인은 드러나는 양각보다 세밀한 음각 표현을 더 좋아한다. 양각은 글자를 살리고 바탕을 깎아내는 기법인 반면, 음각은 바탕을 살리고 글자를 깎아내는 기법이다.
그는 “양각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음각은 세밀하다”며 “먹이 떨어지는 부분, 글자의 끝이 삐치는 것까지 다 표현할 수 있는 음각이 서각의 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듣고 공방을 둘러보니 확실히 양각기법을 이용한 작품보다는 음각 기법을 통해 표현한 작품들이 더 많았다. 서예 실력은 그에게 장점이었다. 스스로도 음각 표현을 섬세하게 한다고 자부하는 그는 그 이유로 ‘필맥’을 알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진짜’ 글을 쓴 것처럼 표현한다는 것. “음각에서는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필맥을 아니까요.”
전통을 잇는 석로(碩路) 김창식 명인
김 명인은 본명보다 더 많이 불리는 이름이 있다. 바로 ‘석로(碩路)’다. 클 석, 길 로. ‘석로’는 김 명인의 호다. 자기 자신을 무단히 노력하고 개척하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서예 스승님께서 지어주셨다. 그는 웃으며 “대한민국에서 ‘석로’라는 호를 쓰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름보다 더 많이 불리기 때문에 ‘호’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작품에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그는 공방에서 문하생들을 가르치기도 한다. ‘직업’이 아닌 전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전통을 잇고 싶은 작은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니고 있는 회사 내에서 ‘재능기부’ 형식의 모임을 조직하기도 했다.
김 명인은 문하생들에게 말한다. ‘아마추어’이지만 ‘프로 근성’을 가져야 한다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야 한다. 아직 나는 걸음마 단계이지만 분명히 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자만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었다. 허투루, 대충대충 하지 말라는 것. 작품을 완성해서 마지막 고리를 걸 때까지 앉아서 작업하는 내공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대충하게 되면 다음 작품도 대충하게 되고, 결국 대충하는 버릇이 생겨요. 작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습관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창식 명인 작품
또 배울 때에는 실패하는 경험도 필요하다고 했다. 김 명인은 “가끔 공모전을 준비하는 제자들의 작품에 선생이 손을 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나는 배우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야 자기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도 문하생들이 공모전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수정할 부분만 짚어주는 편”이라며 “실수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고마운 사람‘ 가족’
김 명인은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인 외에도 생계를 위해 갖고 있는 직업이 있다. 그는 퇴근 후 작품활동을 하기 위해 ‘집’이 아닌 ‘공방’으로 돌아온다. 그런 그에게 가장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존재가 있다. 바로 ‘가족’이다. 사실 가족의 도움은 어렸을 때부터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않은 그는 예술의 길을 계속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상을 받아 와도 부모님은 ‘취업’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럴 때 김 명인의 형들이 그를 많이 도와줬다. 덕분에 예술을 놓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고 형님들의 도움에 이어 가까운 아내의 도움도 많이 받았다.
“아무래도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작품에 몰두하다보니 회사와 공방을 오가게 되고 가정에 소홀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이 들 때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그는 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사람 관계가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힘이돼 줬던 것은 바로 가족. 친구와 술을 한 잔할 때도 좋지만 정작 힘이 들 때 옆에 있는것은 가족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 명인의 공방을 다니고 있는 문하생은 현재 7명이다. 그는 “나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기능적인 것보다 문화적인 가치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면서 “후손들에게 이 가치를 이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다니고 하루 1,2시간씩 자면서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창식 명인 작품9(김홍도-씨름)
나무에 글 하나, 그림 하나 새길 때 ‘혼’을 불어넣는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한다는 김명인. 아직까지 그는 자신의 작품 중에서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은 없다고 했다.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부족한 모습이 항상 보인다고. 그래서 그는 “작품을 할 때마다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에게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물었다. “전통각에 현대 색채를 가미해서 전통과 현대를 함께 표현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