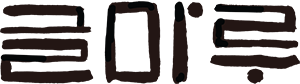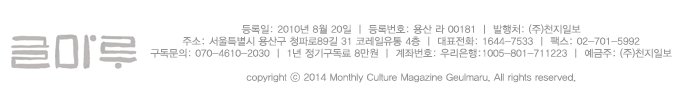막 걸러낸 생生은
삶을 닮았다
허시명 막걸리학교 교장 인터뷰
글. 김일녀 사진. 박완희



막걸리의 매력에 빠져 아예 업을 바꾼 사람이 있다. 업이기에 단순 술꾼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까다롭다. 술평론가로 불린다. 국내 1호라는 수식어도 달렸다. 겉모습만 봐선 ‘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마른 체형에 말수도 많은 편이 아니다. 연한 갈색 뿔테 안경과 차이나 칼라의 셔츠 때문인지 언뜻 보면 신부님 같은 분위기도 난다. 그 또한 스스로를 ‘비사교적’이라고 평했다. 허시명(56) 막걸리학교 대표의 이야기다.
지난 6월 초, 볕 좋은 날 창 너머로 경복궁 뜨락이 내려다보이고 인왕산 자락이 펼쳐지는 막걸리학교를 찾았다. 한쪽 벽면에 가득 진열된 다양한 전통주를 보니 제대로 찾아온 게 맞구나 싶었다. 허 대표는 서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후 잡지 <샘이깊은물>에 입사해 5년간 기자로 일했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아보고 싶어서, 타인의 삶을 엿보고 싶어서’ 기자의 삶을 살다가 자유롭게 글을 쓰고 싶어 여행작가가 됐다. 그리고 술을 만났다. 새로운 길에 들어선 만큼 중앙대 민속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전통주를 공부했다. 2005년에는 일본으로 가 일본주류총합연구소에서 청주제조자 교육과정도 이수했다. 그 시간들이 쌓여 지금의 술평론가가 됐다. 1999년부터 시작해 술과 인연을 맺은 지 20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전통주와 막걸리에 대한 몇 권의 책도 내고 강연도 다녔다.
“길을 가다 보면 어떤 길은 빠져들고 싶은 마력 같은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작점
허 대표와 마주 앉았다. 잔 받침대에 전남 담양에서 만들어진 우리밀 막걸리 한 잔과 물 한 잔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술 한 잔에 물 한 잔. 그의 주도 중 하나다. 처음 맛보는 밀 막걸리는 탄산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워 여심을 저격하는 맛이었다.
‘막 걸러냈다’고 하여 막걸리다. 쌀과 누룩으로 빚은 술에서 맑은 청주는 떠내고 술지게미에 물을 부어 가며 거른 것이다. 때문에 도수가 소주의 절반 이하인 6~8%다. 우리 민족이 즐겨마신 술 중에 도수가 가장 낮다.

“막걸리의 ‘막’자는 말 그대로 지금 막, 체에 걸러서 편하게 마신다는 의미예요. 한자로는 생(生), 영어로는 ‘Live’인 거죠. 독주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술 못 하는 사람들은 독주 앞에서 상당히 긴장하게 됩니다. 반면 막걸리는 도수가 낮고 부드러워요. 이야기를 풀어내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1960~80년대 막걸리는 대중적인 술이었다. 1970년대에는 전체 술 소비량의 60~70%를 차지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먹고 사는 문제에 골몰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막걸리는 서민과 노동자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벗이었다. 새참으로 한 잔 마시면 허기가 가셨고, 일의 능률이 올랐다. 연로한 부모와 조상을 모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술지게미는 어려운 시절을 넘기게 해준 양식과도 같았다. ‘조강지처(糟糠之妻)’란 말도 ‘얻어 온 술지게미(糟)와 쌀겨(糠)를 먹으며 함께 가난한 삶을 견뎌온 아내’를 이르는 말이다. 실제 밥과 비교했을 때 탁주 지게미의 탄수화물 함량은 조금 떨어지지만 단백질 함량은 더 높고 칼로리는 비슷하다. 반면 소주에는 칼로리만 있고 영양성분은 없다. 이렇듯 막걸리는 우리 민족에게 술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새로운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막걸리 또한 ‘국민주(酒)’ 타이틀을 내려놓아야 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전체 술 소비량의 3~4%대로 추락했다. 그 나머지를 맥주와 소주가 차지했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부터 다시 막걸리 열풍이 불었다. 품질이 좋아지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건강과 저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걸리가 재조명받기 시작했다.
막걸리학교, 전통주에 문화를 입히다
지난 2009년, 한 경제연구소가 막걸리를 ‘최고의 히트 상품’으로 선정했던 그해 말 막걸리학교도 문을 열었다. ‘한국 술이 어떤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문화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 함께 시음하고 가늠하는 공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막걸리를 통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발효세계를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세워진 우리 술교육기관이다. 첫 개강 당시 강의가 있는 날마다 일본에서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한 수강생은 물론, 수강을 위해 일정기간 한국에 체류한 재미교포도 있었다고 한다.

올해 들어 8년 째,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다양하다. 연령대는 갈수록 젊어지고 여성들의 비율도 높아진다고 한다. 보통 40~50대가 주축을 이루는데, 바로 하루 전날 개강한 34기는 평균 30~40대라고 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더 다양한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왔다는 휴학생도 있고, 마을만들기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막걸리를 빚고자 찾아온 이들도 있다고 한다. 현재 진행되는 강좌는 총 33강으로 입문 과정인 인문학과정(10강), 취미로서의 술 빚기(10강), 창업(13강) 등 3단계로 나뉜다.
맛과 향으로 감성을 깨운다
술은 본능을 건드린다. 눈으로 보고 향을 맡고 맛을 본다. 이러한 동물적인 감각을 건드려 본능과 감성을 깨우는 것이다. 시청각 중심의 현대사회가 주는 자극과는 다른 차원이다. 이를 언어화 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삶에서 경험했던 어떤 물상과 연동이 돼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이를 통해 삶이 풍성해진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향이나 맛은 우리 생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은 저장고가 있다면 거기 들어 있다고 해요. 어떤 향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기억하기도 하죠. 그런 기억의 프리즘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삶을 더 기름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도 혼술을 한다. 다만 평론가로서 그의 혼술은 갖춰져야 할 조건이 조금 까다롭다. 맛을 평가하고 기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배부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은 상태여야 하며, 실내로 비쳐드는 자연광과 내부 조명이어우러져 적절한 밝기를 이뤄야 한다. 하루 중 이런 시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은데, 보통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사이 정도를 꼽았다. 이때 술을 맛본다.
“사실 독주가 가장 품격 있는 거죠. 혼자 술을 마시면 살아온 날들이 보여요. 자신에게 주는 가장 여유로운 시간이기 때문이죠. 여성들이 혼술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봐요. 하루 일과를 끝내고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것이죠. 술을 가장 잘 즐기는 방법이 혼술입니다. 단 알콜중독자는 제외예요(하하).”
여행작가인 허 대표에게 술은 자전거와 자동차, 기차처럼 그를 실어나르는, 그의 삶을 움직이는 수단의 하나다. 여행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넓히고 스스로를 깊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세대를 아우르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막걸리가 주는 매력이다.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 술을 닮아가는 것일까.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마시면 사라지고 말듯, 그는 목표가 없는 게 목표다. 그러면서 지난번 헝가리 여행에서 느꼈던 바를 이야기했다. 한국의 전통주를 소개하기 위해 갔다가 일정을 마친 후 주변을 여행하던 중, 어느 성당 아래 넓은 지하공간에 자리한 pub에 들렸다고 한다. 수많은 주민들이 모여 저녁시간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거기서 아무 거리낌 없이 술 한 잔 하던 모습이 가장 생각난다고 했다. 그는 그 순간을 ‘生을 가장 매력적으로 소비하고 있던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순간들을 표집하면서 살아가는 게 목표가 아닐까… ”라고 스치듯 말하는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그의 개인적 목표와 달리 막걸리학교의 앞으로의 계획은 구체적이다. 지금은 교육장과 실습장이 분리돼 있어 안정된 학습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술을 빚을 수 있는 안정된 발효실과 소규모의 주류 샘플 공간 등을 꼽았다. 거기서 하우스막걸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이나 양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도 만들어내는, 이른바 ‘인큐베이팅’ 발효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게 그의 바람이다.
“앞으로는 발효과학을 알고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공산품처럼 찍어내는 술이 아니라 창의적이면서도 정성과 솜씨를 담아낸 술이 빚어졌으면 해요. 막걸리학교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가르치는 공간이 돼야 하겠고요.”
막걸리 열풍이 막걸리의 세계화, 막걸리의 한류도 가능하게 할까. 그의 답은 지체 없이 “그럼요!”였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이란다. 명주는 다 지역구가 있다고 한다. 지역의 이름을 달지 않으면 결코 명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마오타이’나 프랑스의 ‘꼬냑’도 모두 지방 이름을 딴 술이다. 마오타이는 구이저우성의 ‘마오타이’라는 마을에서 생산되며, 꼬냑은 코나크 지
방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를 원료로 한 브랜디다. 와인 또한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명주는 보르도처럼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다.
한민족이 가장 매력적으로 즐길 줄 아는 술, 막걸리. 한옥에서 한식을 먹을 때 전통주가 빠질순 없지 않은가. 이것만으로도 막걸리가 한류 대열에 합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