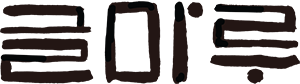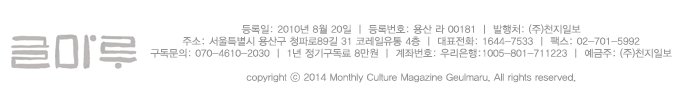고서가 만들어낸
시간의 향기
‘통문관’ 3대 관장 이종운 씨
글, 사진. 김일녀


서울 종로구 인사동거리 초입에 자리한 통문관(通文館). 작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서점이다. 1934년 금항당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가 광복 이후 통문관으로 바꿨다. 고려시대에 역관을 가르치고, 통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던 관청 또한 통문관이다. 문자 그대로 모든 책들이 드나드는 곳이자, 모든 고서가 이곳을 통해 세상과 통(通)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 싶다.
통문관이라 이름 한 이는 1대 관장인 고(故) 이겸로 선생이다. 현 주인인 이종운 씨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 평안남도 용강 출신으로 16세에 일본인이 운영하는 고서점에 취직해 고서와 인연을 맺은 후, 10년 뒤 26살이 되던 해 서점 금문당을 인수하고 상호를 금항당으로 바꾸었다. 처음에는 참고서와 교과서 위주로 취급하다 차차 국학 관련 고문헌 매매는 물론 출판도 하였다.
인사동 터줏대감, 통문관
통문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북적이는 인사동거리와는 전혀 다른 공간이 행인을 맞이한다. 약간 어두우면서도 은은한 불빛과 서늘한 공기, 발걸음조차 숨죽이게 하는 적막함은 모두 고서에 맞춰진 환경이다. 책을 보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습도다. 때문에 옛날 서가는 북쪽 방향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자연적으로 통풍은 되지만 빛은 차단해 책을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마침 통문관 건물이 동향이다. 물론 주인장은 매년 겨울을 날 때마다 반은 골병이 든다며 웃지 못 할 속내를 털어놓는다. 온풍기가 있어도 틀 수 없다. 50~60년 전 책들만 해도 한 자리에서 2~3년만 온풍기를 쐬면 종이가 다 삭아버리기 때문이란다.
사방 벽면과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만한 통로에 놓인 책장마다 책이 빼곡히 쌓였는데 천장에 닿을 듯하다. 총 2만여 권이나 되지만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종류별로, 높이대로 반듯하게 정리돼 있어 기품마저 느껴진다. 고서에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향기가 매력적이다. 수십, 수백 년 전 책들임에도 산뜻한 것은 물론, 서늘한 공기 덕에 상쾌하기까지 하다. 어떤 것으로도 흉내 낼 수 없는 시간의 향기다. 노년의 지혜와 성숙함도 이런 향을 내지 않을까 싶다.
한적을 쌓아놓은 나무로 된 서가 또한 통문관의 역사를 말해준다. 인사동에서 2번 정도 자리를 옮겼는데, 1967년 이 자리에 낡은 목조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당시의 흔적이다. 책장 사이로 난 중앙 통로 너머에 이종운 관장이 낮게 앉아 있다. 이 자리에 앉은 지도 벌써 20년이 됐다. 어린시절 인사동은 그의 놀이터였다. 그가 앉은 자리 바로 옆에서 할아버지께 천자문을 배웠다. 손자에게 주겠노라며 이곳을 찾는 지인들에게 일일이 부탁하여 만들다가 그만 잃어버린 천인천자문을 아쉬워하셨다는 추억도 이곳에 남아 있다.
<월인천강지곡> 찾아낸 이겸로 관장
이겸로 선생은 단순 책방 주인이 아니었다. 그가 직접 쓰고 출간한 <통문관 책방비화>를 보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책은 그가 고서점을 경영하는 동안 선생과 책과 손님 사이에 얽힌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것이다. 6·25전쟁이 일어나자 선생은 가재도구와 옷 보따리 대신 80권짜리 <조선군서대계(朝鮮群書大系)>를 짊어지고 피난길에 올랐다고 한다. <조선군서대계>는 한국의 고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주요한 고금 사료(史料)를 모아 엮은 책이다.
6·25전란 이후는 횡재수가 통하던, 이른바 리어카에서 보물 줍던 시절이었다. 먹고 살기 위해 돈이 된다 싶은 물건이면 죄 리어카에 실려나왔다. 거기서 발견된 귀한 책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그중 하나가 조선 초기 세종이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폐허 속에서 <월인천강지곡>을 찾아낸 것을 생애 가장 큰 기쁨으로 이야기하곤 했다는 게 이겸로 선생과 각별한 인연을 가졌던 유홍준 교수의 말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와 문서들을 발간하다 적발돼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또 심하게 훼손된 고서는 인두로 한 장 한 장 다리고 풀을 먹여 살려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병법서 <기효신서>
1960~70년대 통문관은 국학계의 사랑방 구실을 하였다. 당시만 해도 학회 사무실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이종운 관장이 보여준 흑백 사진 속 옛 통문관 건물을 보면 ‘국어국문학’이라는 작은 현판이 한쪽에 걸려 있다. 그렇게 이겸로 선생은 70여 년간 통문관을 운영하며 수많은 국보·보물급 국학 자료를 발굴하였고, 수집한 고서들은 영인본 등의 형태로 출간하며 국학 발전에 큰 힘을 보탰다.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이종운 씨는 2대 관장이었던 아버지에 이어 1997년 자연스레 통문관을 이어받았다. 운영을 위해 서지학을 공부했고, 또 고적과 고전을 다룸에 있어 갖춰야 할 필수적인 기술들과 문헌들을 정리해 놓은 책을 공구서라고 하는데 집 한쪽 벽면을 다 채울 정도라고 한다. 물론 한자는 기본이다.
‘견물생심’이라고 이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책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본의 아니게 수집가가 됐다고 한다. 누구보다 이성적인 성격도 책앞에서는 무너지고 만다. 돈이 안 되더라도 희귀본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책을 구하러 종종 일본에 가기도 한다.
고서로 맺어진 인연과 인연
고서가 맺어준 인연은 남다르다. 책에도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 일 때문이다. 할아버지께서 자신의 손에 들어온 ‘상해 독립신문’을 연세대로 보냈는데, 50년 뒤 똑같은 신문(170여 부)이 손자 손에도 들어와 이번엔 서울역사박물관에 보내졌다. 통문관을 통해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똑같은 인연이 닿았으니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가끔 인연이 닿으면 할아버지를 통해 책을 매입한 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쯤 장서를 정리하면서 그 책들이 다시 제게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책 뒷면에 가격을 연필로 써 놨는데, 바로 할아버지 글씨체인거죠. 참 재미있어요.”
실제 이겸로 선생의 철칙 중 하나가 ‘언무이가(言無二價)’였다. 값은 두 번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선생은 당시 부르는 게 값이라던 고서점 업계의 관행을 깨고 모든 책에 정가표를 붙였다. 이는 고객과의 신뢰로 이어졌고, 단골이 늘어나면서 서점도 커지게 됐다고 한다.
고서점은 책을 판매하고 매입하는 게 주된 일이지만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을 통해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잊지 못할 인연도 쌓여간다. 그의 마음에 빚으로 남아 있는 일이 있다.

“오래 전 야구선수였던 고(故) 박상규 씨가 책을 처분하겠다고 연락을 해와 댁으로 가서 셈을 쳐 드리고 책을 싣고 나오는데, 그 분이 차를 좀 태워달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갈비탕한 그릇 살 테니, 같이 먹겠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당시 저는 바로 다음 약속이 있어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집에 멍 하니 계셨던 그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걸려요. 지금의 저였다면 약속을 미뤘을 텐데… 그때는 제가 젊었었던 거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을 물었더니 재밌는 인사가 생각났단다. 그도 그럴 것이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관료인데, 똑같은 책이라도 상태가 더 깨끗한 걸 좋아하는 취향 때문에 자신의 책보다 통문관 책이 더 깨끗하면 ‘차액을 줄 테니 바꿔달라’고 그렇게 떼를 써 난감했다고 한다.
책이 주인이다
통문관의 주인은 종종 찾아오는 손님도, 이종운 관장도 아니다. 책이 주인이다. 때문에 이 관장은 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모든 물건에는 주인이 따로 있는 법이니,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와도 그런 사람은 원하는 책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다.
“책에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10년 동안 한 번도 서가에서 뽑힌 적 없는 책들이 며칠 새 몇 명이 뽑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죠. ‘네가 이제 나갈 때가 됐구나’ 하고. 그러면 정말 주인을 만나더라고요.”
통문관이 문을 연 지 올해로 벌써 83년째다. 이종운 관장에 이어 그의 20대 아들이 대를 이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100년 뒤에도 고서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숨 쉬고 있겠지만 시간의 무게가 쌓이는 그 만큼 일반인들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기 전에 좋은 자료들이 제 자리를 얼른 찾아갔으면 좋겠다는게 그의 소망이다.
‘적서승금(積書勝金)’. 통문관에 걸려 있었다던 편액으로 ‘책을 쌓아두는 것이 금보다 낫다’ 는 뜻이다. 80 평생을 수많은 고서와 고문헌 속에서, 그 지혜더미 속에서, 책 한 권 한 권이 모여 흐르는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살았던 이겸로 선생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