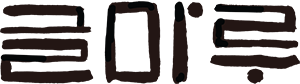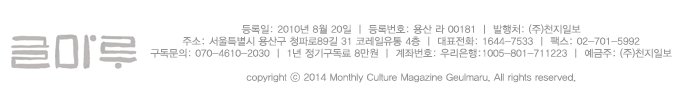남사당 줄타기,
그 어름 같은 판을 보셨는가
글. 김소형

풍물굿이로구나, 얼쑤!
판판판, 판이 벌어졌다. 대체 무슨 판인가. 줄타기와 합굿이라 했다. 줄타기라면 영화 <왕의 남자>에서 나와 흥행몰이에 큰 공헌을 세운 그 외줄타기렷다. 또 합굿이라면 아랫마을 윗마을 잔치하면서 불러들인 풍물굿이니, 큰 잔치 때 제일로 치던 것이 줄타기라. 구경꾼들의 심장을 쥐락펴락 하는 줄타기 놀음이 풍물굿에 빠질 수 없다.
시간 어림하여 공연장에 다다르니 마침 풍물패가 들어오는 참이다. 꽹과리와 징 소리가 쟁쟁 귀를 울리는 가운데, 망태기를 걸머진 대포수가 앞장서고 커다란 깃발 두 개가 흔들리며 다가왔다. 용이 그려진 깃발의 위세와 함께 풍악소리도 하늘을 찌르고 놀음옷 갖춰 입은 풍물패들의 발걸음도 활기에 차 있다. 야외 공연장까지 대포수를 따라 걸어가는데 풍악 때문인지, 행렬의 흥에 동화된 탓인지 나도 한껏 고무되는 기분이었다.
멍석이 깔려있는 야외 공연장으로 들어서니 본격적으로 판이 벌어졌다. 맨 처음 순서는 고사 지내기, 사람들이 모여 판을 벌이고 노는 마당인데 어찌 하늘에 고하고 땅에 고하지 않을까. 정성스레 초를 켠 뒤 고사소리인 ‘비나리’와 함께 잔을 올리고 절하고 축원하는 고사가 이어졌다. 사회자의 너스레와 함께 절을 하는 이들이 물러나자 이제 풍물패들이 자리를 차지한다.
풍물은 남사당놀이의 여섯가지 재주인 풍물, 버나(대접돌리기), 살판(땅재주), 어름(줄타기), 덧뵈기(탈놀음), 덜미(꼭두각시놀음) 중 대표격인 놀음이다. 북과 장구, 징과 꽹과리와 소고가 흥겨운 장단에 맞춰 돌아갔다. 상모돌리기는 물론이고 풍물판의 꽃이라는 꽹과리 쇠잡이(상쇠)의 부포놀이도 등장한다. 부포에 어찌 저리 크고 환한 꽃이 피었을꼬. 풍물 장단에 맞춰 꽃이 피고 오무라들 때마다 탄성이 이어졌다.
초립 차림에 부채를 든 매호씨(재담을 주고받는 상대)도 등장하여 관객들과도 주거니받거니, 풍물패들과도 재담을 섞으며 흥을 돋운다.
“여기서 우리가 한바탕 놀라는데 잠잠허니 반응이 없으면 어쩌겠어요? 기운이 빠지겠지요? 자, 따라해보세요~ 얼씨구~!”
“얼씨구~!”
얼씨구, 좋다~, 고놈 참 잘헌다~! 놀이에 추임새가 섞여들면 놀이하는 사람도, 관객들도 기분이 좋아지고 흥이 난다. 그 흥을 타고 버나잽이가 나와 대접돌리기 재주를 부렸다.
“우와~!”
공중으로 높이 치솟아 오른 커다란 대접을 기다란 작대기 하나로 받아내는 솜씨가 일품이다. 일부러 못 받고서 박수소리가 작아서 떨어뜨렸다며 관객들에게 투정부리는 것도 깨알 같은 잔재미. 버나잽이가 재주를 부리고 들어가자 드디어 줄타기 무형문화재인 권원태 선생이 모습을 드러냈다.


외줄타기
위태로울수록 더 높이 솟구치리니
권원태 선생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장생의 대역을 맡았던 줄타기 명인이다. 태평소의 주도로 굿거리장단, 타령장단 등의 풍물 반주가 곁들여지는 가운데 줄꾼이 줄 위에 올라섰다.
“이 어름산이 잘 하면 살 판이요, 못 하면 죽을 판이라”
“얼쑤~!”
줄타기를 하는 사람을 ‘어름산이’라 부르는데, ‘어름’이란 줄타기놀이의 남사당 용어로서 ‘얼음 위를 걷듯이 조심스럽고 어렵다’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다. 어름산이는 매호씨와 입담을 주고받으면서 3m높이의 외줄 위에 아슬아슬 섰다.
3cm 굵기에 3m의 높이, 9m의 줄. 땅에서 멀어진 만큼 하늘과 가까워졌다. 한 발씩 떼어 앞으로 나아가거나 뒤로 걸어가거나, 흔들리는 외줄 위에서
중심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딱 우리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인생, 한 발짝만 잘못 내딛어도 바닥으로 내리꽂힐 형국이다. 그러나 줄이 능청능청 늘어지는 만큼 튕겨오르는 높이도 더 높아지니 어찌 신기하지 않을까. 위태로울수록 더 높이 솟구친다. 우리 삶이 그러하듯이.
“이번에는 양반님네 걷는 모습 좀 보더라고. 이 양반 어찌나 느릿~느릿~ 걷는지 성질 급한 사람은 못 보는 것이렷다”
줄꾼은 이 정도쯤 대수일소냐고 걸쭉한 입담을 곁들여 줄을 탔다. 점잔 떠는 양반걸음, 뾰족구두 신고 엉덩이 실룩이며 걷는 여자걸음, 한발로 껑충껑충 앙감질로 걷거나 앉은자세로 나아가기 등 외줄 위에서 몸을 놀리는 데 하등 두려움이 없다.
“잘한다~!”
초로의 남자관객이 감흥에 젖어 소리를 질렀다.
“하늘을 좀 보시요, 달님도 줄타기 구경할라고 벌써 나왔구만요!”
그 소리에 모두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직 밝은 시간인데 이른 초저녁달이 희끄무레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그 풍경이 마음속에 각인되었다. 무형유산원 야외 공연장을 둘러싸고 있는 야트막한 산과 그 산 위에 걸터앉은 달, 그리고 달이 내려다보는 앞에는 줄 위에 서서 부채를 펴들고 있는 어름산이가 있었다.
찰칵.
태평소의 선율이 이상하게 자꾸만 귓속으로 파고 들었다. 맑고도 애절한 소리. 민간에서는 ‘날라리’라는 별칭으로도 불린 태평소는 원래 화란(禍亂)이나 질병을 물리치고 풍년이 드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의식에 쓰이던 악기였다. 소를 불면 그 소리가 세상을 두루 편안하게 해준다고 믿었다. 임진왜란 때 홍의장군 곽재우가 전술적으로 사용했던 악기도 이 태평소라 했던가. 태평소 소리처럼 아득한 듯 가깝고, 애절한 듯 흥겨운 줄타기가 끝났다.

기접놀이
쌍용(雙龍)의 장쾌한 기세, 기접놀이
이제 판의 마지막을 장식할 기접놀이 차례다. 풍물패들이 다시 나와 흥겨운 재주와 놀음으로 한바탕 돌아간 뒤, 사람들 시선이 한곳으로 쏠렸다. 커다란 용기(龍旗)의 등장이다. 깃발을 움직이는 기재사(旗才士)들이 다리 사이에 용 깃발을 끼운 채 앞으로 걸어 나왔다. 허벅지로 깃발을 지탱하면서 깃발에 매어놓은 끈을 잡고 기를 휘두르거나 내려깔거나 펼쳐보이니 그야말로 역사(力士)의 기운이다. 기재사들이 이마에 깃발을 올려놓고 세웠을 때는 절로 입이 떡 벌어졌다. 펄럭이는 깃발의 위세도 대단하거니와 그 거대한 깃발을 움직이는 사람의 힘도 대단하다.
길이 5m, 폭 3m의 크기의 깃발은 흰 바탕에 용이 그려져 있으며 한쪽에 제작연월일이 기록돼 있다. 제작연월일이 적힌 부분은 새 천으로 갈지 않으며 기주는 길이 15m, 지름 15~20cm의 대나무인데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 그 속에 나무를 채워 넣는다 한다. 짧으면 3일, 길면 7일 동안 행해졌던 기접놀이. 한때는 구경꾼이 1천여 명에 달한 적도 있었다니, 가히 공동체 마을축제의 백미라 부를 만하다.
판판판 축제의 첫 번째 판이 막을 내렸다. ‘무릇 판이라 하는 것은 차일 치고 멍석 펴고, 안성마치 깽쇠 치고 운봉내기 징 치면서 멍석판에 탁주사발 돌아가는 것이 법도’라 했던가. 탁주사발은 빠졌지만 멍석 끄트머리에 끼어 앉아 풍물패의 흥겨운 판에 같이 할 수 있음이 고마웠던 시간.
돌아오면서 자꾸만 용 깃발이 눈에 아른아른하였다. 용아, 날아오르거라! 꿈틀꿈틀 솟구쳐 올라가는 시퍼런 기운, 그 웅장하고 시원한 기상을 들이마시고 싶어서 나는 자꾸만 심호흡을 하였다.

|
용기(龍旗) 놀이
‘용기(龍旗)놀이’라고도 불리는 기접놀이는 전주시 삼천동과 평화동 일대 마을에서 성행한 민속놀이로서 주로 칠석이나 백중날 한 마을의 초청으로 행해졌다. 마을별로 용기(龍旗)를 제작해 기량을 겨룸으로써 상호 친목과 단결, 협동을 도모하는 대단위 집단공연이었다. 이 경연 결과로 마을의 순위가 결정되면 모두 모여 합굿놀이를 벌이고 주최마을은 전송굿을 하며 초청마을을 떠나보낸다. 전주 기접놀이는 2016년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