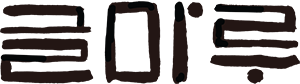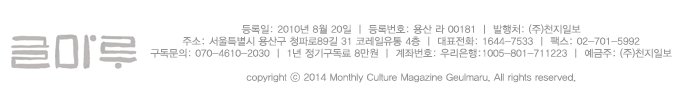하늘이 숨겨 놓은 비밀
관악산·청계산, 과천서 찾다
글, 사진. 장수경
제법 공기가 차다. 산천초목도 다가올 겨울안식을 기다리듯 울긋불긋 단풍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한그루 나무에도 생명이 있듯, 울창한 숲도 살아 숨 쉬지 않던가. 그래서 사람처럼 산(山)도 저마다의 이름을 가져왔다. 생각해보면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다. 인명(人名)과 지명(地名)이 장차 이루어질 예언과도 같아서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허투루 이름 짓지 않았다. 청계산과 관악산, 그리고 그 속에 자리한 과천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이곳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었던 걸까. 탐방팀은 이를 알기 위한 여정을 떠나봤다.
풍수가들도 주목한 땅
중국에 ‘소상팔경(瀟湘八景)’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관동팔경(關東八景)’과 ‘단양팔경(丹陽八景)’이 있다. 하나를 덧붙이면 과천의 ‘군동팔경(郡東八景)’이다. 예로부터 청계산(해발 618 )과 관악산(해발 632.2 ) 일대는 수려한 산세와 경치로 이름나 있었다. 경기도 안양·의왕·성남이 있고 서울 도심과도 가까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또 관악산과 우면산 사이의 남태령은 조선 한양의 관문이었고 오늘날까지도 주요 교통로다.
관악산이 남성적이라면 청계산은 여성적이다. 그럴만한 것이 관악산은 불처럼 강인한 기운을, 청계산은 고운 자태를 뽐내서다. 또옛 풍수가들은 관악산을 우백호, 청계산을 좌청룡이라 했다. 그야말로 과천은 풍수명당이었다.
관악산 연주대
‘청계산(淸溪山)’은 산에서 흐르는 물이 맑다해서 이름이 붙여졌다. ‘청룡(龍)산’이라고도 불렀는데 푸른 색 용이 산허리를 뚫고 하늘로 승천했다는 설화 때문이다. 산세는 그리 높지 않다. 대신 망경봉(주봉, 618 )과 옥녀봉 등 여러 봉우리가 남북으로 길게 이어졌다. 이곳은 소나무 숲으로 공기가 무척 상쾌하다. 산 이름이 참 잘 어울린다.
산을 오르면 가장 먼저 옥녀봉을 만난다. 여성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옥녀봉. 조선 말기 추사 김정희는 이곳 북쪽 자락에 초당을 짓고 말년을 보낸다. 산언덕 아래엔 ‘혈읍(血泣)재’ 고개가 있다. 조선 성종 때의 대학자인 정여창에 얽힌 이야기가 내려오는 곳이다.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에 연루된 그는 목숨을 지키고자 이곳에 숨어드는데 고개를 넘으며 피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청계산 매봉 비석
깔딱고개와 매봉을 지나면 청계산 주봉인 ‘망경봉(望京峰)’을 만나게 된다. 고려 멸망 후 조견 등 충신은 이곳에서 수도 송도를 바라보며 세월의 허망함을 탄식한다. 슬픔을 간직한 망경봉이지만 이를 삼켜버릴 만큼 눈부신 비경을 자랑하고 있다. 건너편에 보이는 관악산, 그리고 산에 포근히 감싸인 과천. 과연 풍수가들이 명당으로 꼽을 만했다.
청계산의 다른 봉우리도 저마다의 뜻이 담겼다. ‘이수봉(貳壽峰)’은 목숨을 두 번 건진 곳, ‘국사봉(國思峰)’은 망해가는 나라를 사모한다는 의미다. 이로보아 청계산은 멸망하는 고려를 생각하면서 재건을 고민하던 사람들과 연관된 산이었다. 그럼 청계산을 마주보는 관악산은 어떤 뜻이 담겨있는 걸까
‘관악산’ 새 시대 알리다
관악산은 산 전체가 ‘갓(冠)’을 쓴 모양이다. 그래서 ‘갓뫼(간뫼)’ 또는 ‘관’이라 했다. 우리 조상도 의복에 반드시 갓을 썼다. 갓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하늘과 소통하는 민족임을 증명한다. 그런데 관악산도 갓 모양 아니겠는가. 마찬가지로 이 산도 하늘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암석마저 하늘로 올라가는 불꽃 모양이다.
관악산은 서울과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의 경계에 있다. 정상의 관측소를 중심으로 사방팔방으로 능선이 뻗어 있다. 그래서 곳곳으로 등산객이 산에 오를 수 있다.
이처럼 지금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산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세상이 두려워하던 화산(火山) 즉, 불의 산이었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과 마주보는 위치였는데 풍수적으로 ‘화기(火氣)’가 강해서였다. 조정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온갖 비책을 세운다. 산 정상에 우물을 판 후 구리로 만든 용(龍)을 우물에 넣어서 화기를 막았고, 경복궁과 관악산을 잇는 일직선상에 숭례문(崇禮門)도 세웠다. 보통 현액(懸額) 글씨는 가로로 쓰는 게 관례였지만
숭례문은 세로였다. 불꽃 모양인 ‘숭(崇)’자가 더욱 잘 타오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다. 숭례문 앞에 남지(南池)라는 인공 연못도 만든다. 물짐승인 해태상을 경복궁 대문과 건물 좌우에 놓기도 했다.
이처럼 화기를 막기 위한 왕실의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관악산 주봉은 연주봉이다. 이곳은 여러 개의 크고 작은 절벽이 솟아있다. 특히 관악산 명소인 ‘연주대(戀主臺)’는 깎아지른 듯한 기암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려 만들었는데, 보는 이들이 감탄할 정도로 장관을 이룬다.
‘주인을 연모한다’는 뜻의 연주대는 두 가지 설화가 전해진다. 첫 번째는 고려가 멸망하자 충신들이 수도 개성을 바라보며 고려 왕조를 그리워하며 한을 달랬다는 내용이다.
관악산 정상 비석
두 번째는 조선 태종 이방원의 두 아들과 관련 있다. 맏아들인 양녕대군과 둘째 효령대군은 셋째 충령대군(세종대왕)이 왕위를 잘 물려받도록 궁궐을 떠난다. 그리고 이들의 발길이 멈춘 곳이 궁궐이 내려다보이는 관악산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왕위에 대한 미련은 계속 쌓여만 갔다. 좀처럼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에 관악산에 남아 있던 효령대군은 산 아래 ‘연주암’으로 거처를 옮기고 수도생활을 시작한다.
좌)조선 태종 이방원의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의 영정을 모신 효령각, 우) 효령대군 영정
원래 이곳에는 신라 문무왕 때(677년) 의상대사가 관악사(冠岳寺)와 함께 세운 작은 암자였다. 이후 관악사가 폐사되면서 연주암이 생기고 의상대는 연주대로 이름이 바뀐다.
그동안 연주암 효령각(孝寧閣)에는 효령대군의 영정을 보관해왔다. 효령대군은 문무를 겸비하고 지덕을 고루 갖춘 인물이었다. 또 90세까지 장수하며 모든 덕망을 받으며 살았다. 효령대군의 덕으로 현재 전국에 50만 여명의 후손이 있으며, 여전히 왕성한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청계산과 관악산은 긴 역사를 함께 호흡해왔다. 그러면서도 두 산은 확연히 달랐다. 청계산은 끝나가는 한 시대를, 관악산은 새로운 시대가 숨겨져 있었다. 그럼 단순히 역사속의 두 시대인 걸까. 그렇지 않다. 이같이 확신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주대가 바라보는 방향 때문이다. 만약 연모의 대상이 조선 임금이었다면 궁궐 방향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연주대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했다. 바로 ‘청계산 자락’이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대상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동방(東方)’이라 불리던 과천(果川)
그럼 무엇을 말하는 걸까. 이를 알려면 우선 관악산과 청계산 사이의 ‘과천(果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과천은 삼국시대 때 백제 영토였다.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으로 한수 이남까지 고구려 영토가 되는데 이때 과천이 고구려로 흡수되고 ‘동사 힐’로 불린다. 지명의 어원을 보면 돋을 ‘동’, 고을 ‘힐’을 써서 ‘해가 돋는 곳’, 즉 ‘동방(東方)’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밤나무가 울창한 고을 이어서 ‘율목’이라고 불렀다. 이후 조선의 태종 이방원 때에 ‘과천(果川)’으로 이름이 바뀌고 오늘날까지 불려졌다.
과천 청계산 자락의 대표 마을은 ‘막계리(莫溪里)’다. 이곳 일대에는 서울랜드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동물원·식물원이 자리하고 있다. 인공저수지도 있다. 원래 이곳은 흐르던 물이 양재천으로 빠져 한강으로 흐르는 지형이었다. 그런데 인공저수지가 생기면서 흐르던 물은 막혀버린다. 여기서 잠시 지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명이란 이뤄지는 예언과도 같다고 하지 않았던가. 즉, 맑은 물이 흐르던 청계(淸溪)가 막계(莫溪)로 되면서 지명 안의 뜻이 실제로 이뤄지게 된다. 또 막계리 안쪽에 ‘광명(光明)’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도 있었다. ‘밝은 빛을 비추는 고을’이라는 뜻이니 이 또한 동방이다.
이처럼 과천은 예부터 동방과 관련된 땅이었다. 강원도 강릉에 가면 해가 뜨는 방향을 정동진이라 하듯, 과천도 정동 방향을 하고 있다. 만물의 이치를 보아도 과천은 ‘해 뜨는 곳’이 맞다. 그럼 지구상에 해가 떠오르지 않는 곳이 없는데, 해가 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기독교 성경에 보면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을 ‘해’라고 비유했다. 즉, 동방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곳을 뜻한다.

관악산 정상에서 바라본 전경. 건너편으로 청계산이 보이고 아래로 과천시가 있다.
인류 역사상 처음 동방이 등장한 곳은 어디일까. 이 또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방의 에덴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하지만 아담의 죄로 실낙원(失樂園)이 되고 하나님은 잃어버린 동방의 에덴을 되찾기 위해 6000년 간 역사하신다. 이곳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끝이 난다고 했다. 그럼 도대체 여기가 어디란 말인가. 우리가 이름에 주목해온 이유가 바로 이곳을 찾기 위해서다. 그리고 시대마다 이름이 바뀌었지만 ‘동방’이란 뜻을 담고 있던 곳을 발견했다. 바로 ‘과천’이다.
이곳이 예언가이자 천문학자인 격암 남사고 선생이 쓴 <격암유록> 속의 ‘서기동래(西氣東來)’가 이뤄지는 동방이요, 예수님이 약속한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사건 현장이다. 그리고 실제로 54년 전 청계산 자락에 ‘장막성전’이 출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배도, 멸망, 구원의 사건이 시작됐다.
‘세인하지(世人何知)’라는 말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라는 이 말 속에는 세상이 알아주지 못해 답답하고 애통해하는 창조주의 심정이 담겨 있다. 그러나 만물 가운데 신의 뜻이 담겨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창조주는 어느 한 때를 위해 긴긴 세월 역사 해왔고, 그 때가 되었을 때 기록된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완성하신다고 했다. 관악산과 청계산도 마찬가지다. 그 이름 안의 뜻을 통해 창조주의 역사를 확증해 가는 거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 한때가 언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깨달아야하는 의무를 가졌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 그러니 ‘언중유골(言中有骨)’이라 하듯 그 뜻을 깨달아가는 자세를 더 늦기 전에 가져야 하지 않을까.
청계산 주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옥녀봉. 54년 전 옥녀봉 아래에는 ‘장막성전’이 위치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