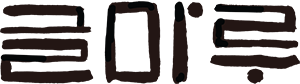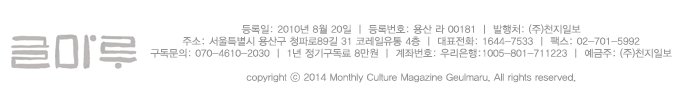임진강 따라 걷는 평화누리길
오늘을 직시하고
내일을 소망하는 길
글. 김일녀 사진. 글마루
장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임진강 전경
연일 세계 곳곳에서 테러 소식이 끊이지 않던 지난 7월 어느 날, 서울에서 자유로를 달려 파주 평화누리길로 향했다. 가다 보니 자유로 왼편으로 철책선과 경계초소가 이어졌다. 철책은 갈수록 더 높아졌다. 어느 순간 도로 표지판에는 개성, 평양이 보이기도 했다. 낯선 풍경들. 하지만 현실이었다. 이름은 자유로지만 그 자유의 끝은 정해져 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내 자유의 다리가 이 길의 끝이다. 호기심과 긴장감, 평소 느껴보지 못한 감정들이 뒤섞였다.
한 시간가량 걸려 도착한 곳은 파주 화석정. 이곳은 평화누리길 12코스 중 8코스를 걷기로 한 이 날의 도착 지점이다.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후 택시를 불러 임진각으로 향했다. 라디오에선 비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사연이 줄을 이을 만큼 불볕더위의 날씨였다. 그래서 원래의 코스(반구정~율곡습지공원)를 조정해 출발은 임진강역에서, 도착은 화석정까지로 정했다. 따져 보니 본 코스(13㎞)보다 3㎞ 정도 줄었다.
평화누리공원
평화의 바람 가득한 그곳
임진각과 평화누리공원
우선 임진강역에서 가까운 임진각과 평화누리공원을 둘러보기로 했다. 공원 곳곳에는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다양한 조형물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도 형형색색의 바람개비가 가득한 바람의 언덕은 단연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이었다. 철근과 대나무로 사람의 모습을 형상화한 ‘통일부르기’라는 제목의 조형물은 모두 네 점으로 구성돼, 키가 점점 자라는 모습을 연상케 했다. 언덕 아래쪽에서 바라보면 제목 그대로 나지막하면서도 간절히 통일을 호소하는 듯 보였다. 수많은 바람개비도, 공원 언덕의 절반 정도에 걸쳐 둘러선 흰 천들도 모두 바람을 맞아들여 쉴 새 없이 돌고, 또 펄럭였다. 공원을 둘러보는 사람들의 발걸음에서도 평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듯했다. 그렇게 넓은 접시 모양의 공원 안에는 평화의 바람만 가득 담겼다.
임진각으로 이동해 전망대에 올랐다. 평화누리 공원과 주변 관광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임진강을 가로질러 북으로 향하는 경의선 임진강 철교와 자유의 다리, 그리고 6.25전쟁 당시 파괴돼 교각만 남은 구 임진강 철교가 보였다. DMZ 열차를 타고 저 철교를 건너면 우리나라 최북단에 있는 도라산역에 도착한다. DMZ 열차가 운행을 시작한 것도 2년 정도에 불과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개성과 평양을 지나 저 멀리 신의주까지 달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고 빌었다.
임진각 본관 건너편에는 북한 실향민들이 명절 때마다 찾는 망배단(望拜壇)이 있다. 그곳을 지나쳐 발걸음을 옮기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노랫 소리가 들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 박건호 작사, 남국인 작곡, 가수 설운도가 노래한 ‘잃어버린 30년’이다.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방영됐던 ‘이산가족찾기’의 배경음악이 되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흥얼거렸던 노래가 분단으로 고향을 잃어버린 아픔을 표현한 노래였다니. 몰랐던 것에 대한 죄스러움과 애끓는 노랫소리가 가슴을 파고 들었다. 망배단 뒤편으로는 나무를 짜 맞추어 만든 83m 길이의 ‘자유의 다리’가 있다. 100m도 채되지 않는 이 다리를 통해 1953년 한국전쟁 포로 1만 2773명이 건너왔다. 때문에 자유의 다리라고 이름 붙여졌다. 당시 포로들은 차량으로 경의선 철교까지 이동한 뒤 걸어서 이 다리를 건너왔다고 한다.
자유의 다리 왼쪽으로는 철책으로 둘러싸인 곳에 낡은 기관차 하나가 멈춰 서 있다. 6.25전쟁 때 신의주로 향하던 도중 폭탄을 맞아 그 자리에 멈춰 선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의 화통이다. 이 열차를 운전했던 기관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군수 물자를 운반하기 위해 개성에서 평양으로 가던 중, 중공군에 밀려 장단역까지 내려왔고 결국 후퇴하던 연합군이 북한군에 이용될 것을 우려해 열차를 폭파하면서 이 화통만 남게 됐다. 크고 작은 1000여 개의 총탄 흔적과 휘어진 바퀴가 전쟁 당시의 참상을 짐작케 한다. 기관차 화통 옆에는 ‘임진각’이라고 쓰인 나무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다. 이곳에서 서울은 53㎞, 개성은 22㎞ 떨어져 있다고 한다. 서울보다 훨씬 가깝고,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개성이 있는 것이다. 실감이 잘 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는 눈은 더욱 분명해졌다.
이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무뎌져 있던 마음 한구석이 깨어나는 듯했다. 내가 발 디딘 이 땅의 아픈 역사와 희생 위에 살아가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찾아와 보고, 듣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평화의 바람이 넘쳐나면 언젠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때, 곧 평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임진각 표지판
평화누리길 표지판
임진강
묵직한 임진강, 그 깊음이 주는 위로
임진각을 나와 임진강역으로 이동했다. 전봇대등에 설치된 평화누리길 표지판이나 나뭇가지에 묶인 리본을 이정표 삼아 본격적인 평화누리 길 걷기에 나섰다.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안 해도될 만큼 잘 표시돼 있었다. 산으로 둘러싸인 논과밭, 개울물을 따라 걸었다. 길 옆 풀숲에는 빨간 멍석딸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고, 여치가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다. 백로도 반가웠다. 논에서 먹이를 찾아 느릿느릿 움직이다가, 여유 있는 날갯짓으로 날아가는 모습은 논을 둘러싸고 있는 철책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다. 폭염 아래 그늘 한 점 없는 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길을 걷는 이유와 목적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 평화롭기 그지없는 농촌 들판을 보며 걷는 것도 나쁘진 않았지만 아쉬운 마음도 컸다. 철책만 없다면 임진강을 바로 왼편에 끼고 걸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평화누리길 중간중간에는 도보 여행자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나무데크 구간이 새로 설치돼 있어 걷는 재미를 더해주었다. 쉼 없이 1시간가량 걸어오니 마을이 나타났다. 장산1리 마을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양해를 구하고 시원한 물을 얻었다. 잠시 쉬다가 평화누리길 8코스의 숨은 명소로 향했다. 임진강역에서 시작해 2시간 넘게 걸어오면서 서서히 말이 없어질 때쯤 장산전망대에 도착했다. 방언이 터지기라도 한 듯 탄성이 절로 나왔다. 엄지가 절로 세워졌다. 저 멀리 개성공단, 개성시 외곽은 물론 장군봉, 초평도, 송악산 등이 어렴풋이 보였다. 뉴스로만 보고 들었던 북한의 모습이다. 나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실향민들은 오죽할까. 그곳에서 자연이 만들어낸 선물을 발견했다. 폭이 좁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남쪽으로는 넓은 논 부지가, 북쪽으로는 초평도가 펼쳐졌는데 임진강과 주변 지형이 만들어낸 모습이 마치 하트(♡) 모양 같았다. 이처럼 자연은 이념과 상관없이 양쪽 모두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있었다. 임진강 물길 중 유일한 섬, 초평도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땅이다.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한다. 언제까지나 평화로움 그 자체로 남아 있기를 바랐다.
다시 산길을 따라 1시간을 더 걸어 화석정(花石亭)에 도착했다. 화석정은 임진강가에 세워진 정자로 조선 중기의 대(大) 학자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난 뒤 제자들과 함께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이다. 원래 고려 말의 유학자 야은 길재가 조선이 개국 되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던 곳이었는데, 사후 그를 추모해 서원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그 후 폐허가 됐다가 율곡 이이의 5대조인 강평공 이명신이 물려받아 정자를 지은 후, 화석정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화석정에 오르면 드넓게 펼쳐진 임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참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몸과 마음을 맡겼다. 화석정 양쪽에는 이이의 어린 시절 추억을 공유했을지도 모를 500년도 넘은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지금은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든 화석정의 쓸쓸함을 달래주는 듯하다. 이이가 태어난 곳은 외가가 있던 강릉이지만, 어린 시절은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 파주시 파평면 밤골마을에서 보냈다. 이이는 8세 때 화석정에 올라 시 한 편을 지었다. 이 밖에도 정철, 송시열 등 많은 문인이 여기서 시조를 읊었다고 한다
<화석정시>
林亭秋已晩(임정추이만) 騷客意無窮(소객의무궁)
遠水連天碧(원수연천벽) 霜楓向日紅(상풍향일홍)
山吐孤輪月(산토고윤월) 江含萬里風(강함만리풍)
塞鴻何處去(새홍하처거) 聲斷暮雲中(성단모운중)
-율곡 이이
숲 속 정자에 가을이 이미 깊어 드니
시인의 시상이 끝이 없구나.
멀리 보이는 물은 하늘과 연하여 푸르고
서리 맞은 단풍은 햇볕에 붉구나.
산은 외로운 둥근 달을 뱉고,
강은 만 리의 바람을 머금었도다.
변방의 저 기러기 어디로 가는가
아득한 울음소리 저녁 구름 속으로 끊어져 버리네.
고려의 역사가 잠든 숭의전
고구려의 위상 깃든 당포성
평화누리길 걷기 이틀째, 8코스에 이어 연천에 속한 11코스 중 일부를 걷기로 했다. 이번에도 코스를 조정, 숭의전에 차를 세워 두고 걷기 시작했다. 숭의전은 고려 태조 왕건을 비롯해 현종, 문종, 원종 네 왕과 신승겸, 강감찬, 정몽주 등 고려충신 16명의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조선 초기 이성계가 세웠다고 한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왜 고려 왕들을 위한 사당을 지었을까. 이는 조선이 유교국가로서 역대 시조의 의례체계를 정비하고, 고려 왕족 및 고려 유민 등에 대한 회유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숭의전 제례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봄, 가을 두 차례에 걸쳐 지내고 있다. 파주 화석정을 느티나무 두 그루가 지키고 있듯, 이곳에도 짙푸른 녹음을 자랑하는 느티나무들이 사당을 둘러싸고 있다. 실제 그중 550년이나 된 느티나무 한 그루는 조선 문종 2년에 왕씨자손이 심었다고 전해진다. 위세 높았던 고려 왕실은 오래전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느티나무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다. 숭의전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도로 우측에 묘가 하나가 있다. 바로 조선 성종 16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33년간 숭의전을 지킨 최초의 봉사자, 왕순례의 묘다.
숭의전을 지나 도로를 따라 한참 걸어오면 당포성에 이른다. 당포성은 고구려시대 임진강변에 돌로 쌓은 방어 성곽이다. 임진강의 물길이 만들어낸 수 ㎞에 달하는 수직 절벽은 높이가 20여m에 달해, 별도의 성벽을 쌓지 않더라도 적을 막아낼 수 있는 자연 성벽 역할을 했다. 때문에 평지로 연결된 부분만 돌로 쌓았는데, 이때 사용된 돌이 제주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현무암이다. 실제 성벽의 돌을 보면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다. 당포성이 있는 곳은 강이 크게 굽어 흐르면서 물살이 약해져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여울목으로, 양주 방면에서 북상하는 신라군이 임진강을 건너 개성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해당했다. 때문에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고구려시기에 처음 축조됐지만, 신라가 점령한 후에는 성벽을 고쳐 쌓아 계속 사용했다. 실제 성 내부에서는 고구려 기와와 함께 신라 기와들도 많이 출토됐다. 당포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면 묵직하게 흐르는 임진강과 그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흐린 날씨 탓인지 임진강은 더없이 적막하다. 묵언 수행 중인가. 바라보는 이조차 입을 다물게 한다. 사람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분쟁이 잦은 지역이었던 만큼 모질었던 세월을 보내서일까. 그 모든 것을 삭이고 또 삭여 저 깊은 속내를 얻은 것 같다. 그런 임진강을 닮고 싶어졌다.

숭의전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면 평화누리길 11코스 입구가 나온다.
와들도 많이 출토됐다. 당포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면 묵직하게 흐르는 임진강과 그 주변 풍광이 한눈에 들어온다. 흐린 날씨 탓인지 임진강은 더없이 적막하다. 묵언 수행 중인가. 바라보는 이조차 입을 다물게 한다. 사람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아서일까. 아니면 분쟁이 잦은 지역이었던 만큼 모질었던 세월을 보내서일까. 그 모든 것을 삭이고 또 삭여 저 깊은 속내를 얻은 것 같다. 그런 임진강을 닮고 싶어졌다.
다시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중 ‘연천 UN군 화장장’이라는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다. 연천의 마전 지역과 파주 적성의 감악산 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 중 한 곳이었다. 그만큼 전사자들이 속출했다. 수많은 UN군 참전 용사들을 한 줌의 재로 화해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낸, 역사의 아픈 기억을 간직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동이리 주상절리로 향했다. 이곳은 11코스(숭의전~군남홍수조절지)의 중간지점이다. 강을 따라 수직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졌다. 높이는 약 25m, 길이는 2㎞에 달하며 30만 년 전 한탄강을 따라 흘러온 용암이 임진강을 만나 역류하여 생성됐다. 흐린 날씨에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짙푸른 나무와 담쟁이덩굴 등에 뒤덮인 모습만으로도 장관이었다. 주상절리란 절벽에 수직으로 발달된 틈이 마치 기둥 모양의 암석이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조를 말한다. 화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지표면에 흘러내리며 식는 과정에서 수축하며 규칙적인 틈이 생기는데, 이 틈을 절리라고 한다. 이 절리를 따라 비나 눈 등 수분이 스며들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침식과 풍화가 계속되면 결국 바윗덩어리가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면서 높이가 다른 돌기둥이 생긴다. 이곳은 가을이 되면 절벽을 타고 자라는 담쟁이덩굴에 단풍이 들어 ‘적벽 주상절리’로도 불린다. 마치 붉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듯하며, 그 모습 그대로 임진강에 드리워지면 그야말로 한 폭의 산수화가 펼쳐진다고 하니 아직 여름이 한창인 것이 아쉽기만 했다. 주상절리 초입에서 주변 풍경에 빠져 있을 때, 출발할 때부터 오락가락 내리던 비가 갑자기 장대비로 변했다. 이틀간 폭염 아래 약 15㎞를 걸어온 취재 일행을 격려라도 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주상절리를 따라 걸어볼 수 있는 기회는 다음으로 미뤄야 했다.

당포성에 올라 내려다보면 묵직하게 흐르는 임진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틀간 임진강을 따라 걸어왔다. 임진강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 많진 않았지만, 그 매력에 빠지기엔 충분했다. 임진강의 ‘임(臨)’은 ‘더덜’ 즉 ‘다닫다(다다르다의 사투리)’라는 뜻이며, ‘진(津)’은 ‘나루’라는 뜻이다. 더덜나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 임진강이다. 강을 끼고 있어서인지 가는 곳마다 민물고기로 요리하는 식당이 많았다. 왕씨 이름이 들어간 간판도 눈에 띄었다. 임진강은 남과 북을 잇는 강이다. 북한의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해 황해북도 판문군과 경기도 파주시 사이에서 한강으로 유입되어 서해로 흘러든다. 또 곳곳에는 고려와 그 이전 삼국의 역사가 잠들어 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 북한에 잠들어 있을 문화유산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